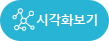| 항목 ID | GC09001354 |
|---|---|
| 한자 | 平生儀禮 |
| 영어공식명칭 | Lifetime Ritual|Pyeongsaeng Uirye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김효경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삶의 고비가 되는 단계마다 거행하는 의례.
[개설]
평생의례는 평생에 걸쳐 지내는 의례라는 뜻으로, 한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삶의 고비가 되는 단계마다 지내는 의례를 말한다. 평생의례는 삶의 단계에 따라 전통사회에서는 출산의례, 혼례, 상장례, 제례 등으로 나뉘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입학식, 군입대, 사회 초년생의 입사 의례 등도 중요한 의례로 간주된다. 평생의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띠기에, 의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보다 전통과 현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출산의례]
부여 지역의 출산 현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해방 전후에 출생한 세대의 경우 자녀를 보통 5~6명 두었으며 자손을 많이 두는 가정에서는 열 명 정도까지도 두는 등 다산을 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산아 제한 정책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점차 자녀를 적게 낳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1960년대까지는 간혹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였으나 산부인과 병원이 대중화된 이후로는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삼신이 아이를 돌보아 준다는 전통적인 관념은 사그라들었다. 아이를 출산하는 방에 삼신상을 놓고, 난산이거나 태어난 아이가 아파도 삼신에게 빌었지만 지금은 병원을 찾는다. 삼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출산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례도 사라졌다. 그나마 혼인 후 자녀가 생기지 않거나 아들을 낳고자 하는데 현대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삼신이나 칠성에게 아이가 점지하여 주기를 빌기도 한다.
[혼례]
부여군에서 혼인할 때 가마를 이용한 세대는 해방 전후 세대이고, 해방 이후의 세대부터는 트럭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시가로 왔다. 195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혼례 풍속도 변화를 겪었다.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이들은 대부분 중매로 배우자를 정하였고, 자신의 거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 주민과 혼인하였다. 젊은이들이 외지로 나가는 일이 흔해지면서 자연스레 연애혼이 늘었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일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는 군내에 들어선 신식 혼례식장에서 결혼을 하였다. 초기에는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하여도 피로연은 동네잔치로 치렀다. 예식 음식을 집에서 만들었고, 예식을 치른 후에도 손님을 대접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예식장 문화가 정착하면서, 동네잔치를 별도로 행하지 않고 전문 음식점에서 음식을 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결혼 당사자들의 맺어짐을 상징하던 사주(四柱)의 의미도 퇴색하였다. 과거에는 평생 장롱 안에 보관하였다가 사망 후에 처리하였으나, 사주를 평생 간직한다는 관념이 옅어지면서 이사나 집의 개축 때 낡은 가구처럼 사주도 버려졌다.
[상장례]
1990년대 이후 장례식장이 보급되기 이전까지 부여 지역은 집에서 상장례를 치렀다. 마을마다 상여를 보관해 두고 주민들이 상여계를 조직하여 상부상조의 분위기 속에서 예를 거행하였다. 장례식장이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절차는 사라졌고, 조문만이 유지되고 있다. 상복은 구매하고, 조문객을 대접할 음식도 전문 음식점에서 배달하여 온다. 일일이 배달하던 부고도 전화로 전한다. 모든 것이 간소화되는 과정에서 미래의 상장례를 대비하여 자손들끼리 조직하여 유지하던 상여계도 의미를 잃었다. 출상 후의 운구도 상여계원이 아닌 자손들의 직장 동료가 맡게 되면서 상여계를 마을보다 회사 내에서 조직하고 있다.
한편, 죽은 이의 혼백(魂帛)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름만 적어 넣는 것과 달리, 부여 지역에서는 죽은 이의 물건을 혼백 안에 넣으며, 대개 죽은 이가 평소에 입던 저고리의 동정을 넣는다. 그저 이름만을 적어 넣지 않고 구체적인 혼백의 주인을 표시하는 물건을 넣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제례]
부여 지역에서 중요시하는 제례로는 기제사, 묘제, 차례 등이 있다. 과거에는 전통을 지켜 제사를 엄중하게 치렀으나 점차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줄고 횟수도 줄었다. 지금은 정월의 설과 팔월의 추석 때만 차례를 지내지만 과거에는 더 많은 절기에 차례를 올렸다고 한다. 기제사는 과거 자시(子時) 무렵에 지냈으나, 요즘에는 자손들이 돌아가야 하므로 저녁을 먹고 어두워지면 곧 지낸다. 기제사를 모실 때 조상 이외에 잡신을 위하여 밥 한 그릇을 떠 올리는 의례나, 차례를 지내기 전에 먼저 성주상을 올리는 등의 의례는 모두 중단되었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제사를 앞두고 부정을 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유지되고 있다. 제사를 지내야 할 시기에 집안에 초상이 발생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며, 마을에 초상이 났다면 그 집에 문상을 가지 않는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정결하여야 하므로 예나 지금이나 부정을 삼간다.
- 『한국의 일생의례』 -충청남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 부여군청(https://www.buyeo.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