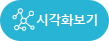| 항목 ID | GC08200056 |
|---|---|
| 한자 | 自然災害 |
| 영어공식명칭 | Natural Disaster |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이원영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개설]
동작구에서 발생했던 지연재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자연재난상황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작구에 발생했던 자연재난 발생 원인은 주로 폭우와 폭우·태풍이 함께 있었던 경우가 주를 이룬다.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연재난상황통계를 살펴보면 주로 풍수해에 해당하는 폭우나 태풍에 의해 건물이나 도로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998년, 2001년, 2011년에 있었으며 주택 침수피해가 전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동작구에서는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에 도림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고, 대방천의 경우 주택 밀집 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암거[상도로 174~상도로 259 구간]를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신설하여 통수능을 향상시켜 침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한다.
[동작구 자연재해의 연도별 피해 현황]
1. 1998년
동작구에서 인명피해는 부상 1명, 건물은 침수 359동, 반파 4동, 유실·전파 2동으로 총 피해액이 80,000천 원이었다. 공공시설은 상하수도 11개소[85,910천 원], 학교 1개소[325,122천 원], 사방시설 9개소[305,046천 원], 소규모 시설물 2개소[94,675천 원], 기타 시설 1개소[24,631천 원], 기타 사육시설 1개소[4,000천 원]의 피해가 있었다.
2. 1999년
동작구에서는 27동의 건물 침수피해만 있었다.
3. 2001년
동작구에서 인명피해는 부상 12명, 사망 4명, 건물은 침수 4,360동, 유실·전파 2동, 반파 1동이었다.
4. 2002년
동작구에서는 148동의 건물 침수피해와 공공시설 중 도로 1개소[1,500m 구간 450,000천 원]과 기타 1개소[60,000천 원]의 피해가 있었다.
5. 2003년
동작구에서는 95동의 건물 침수피해와 공공시설 중 기타 건물 1개소에서 200,000천 원의 피해가 있었다.
6. 2006년
동작구에서는 36동의 건물 침수피해만 있었다.
7. 2010년
동작구에서는 1,361동의 건물 침수피해로 816,600천 원의 피해가 있었다.
8. 2011년
동작구에서는 건물 침수 1,400동과 반파 1동으로 855,000천 원의 피해가 있었다. 공공시설은 상하수도 1개소[200,000천 원]와 사육시설 기타 239개소의 피해가 있었다.
9. 2012년
동작구에서는 8동의 건물 침수피해만 있었다.
[동작구의 기후 특성과 극한기후 현상]
동작구에서 극한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작구의 일반적인 기상 개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작구의 경우 2001~201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기온은 13.2℃, 연평균 일 최고기온은 17.8℃, 연평균 일 최저기온은 9.4℃, 연평균 일교차는 8.4℃이다.
동작구의 2001~2010년 기준 기온의 극한값을 살펴보면 열대야일수와 폭염일수가 각각 9.1일, 9.9일로 나타났다. 열대야일수는 신대방1동[11.3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생하였고 상도1동[5.1일]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폭염일수는 사당1동[12.7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생하였고 상도4동[6.6일]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동작구의 연강수량은 1,355.4㎜인데, 상도4동이 1,375.5㎜로 가장 많았고 노량진1동은 1,321.1㎜로 가장 적었다. 동작구의 평균 강수강도는 17.6㎜/일로 서울특별시의 평균값인 18㎜/일보다 약한 편이었다. 평균 호우일수는 3.2일로 서울특별시 평균과 같은 값이었다. 호우일수는 신대방1동과 신대방2동에서 3.5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흑석동은 3.0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강수 강도는 사당1동과 사당4동이 18.1㎜/일로 가장 강하였고 흑석동과 상도1동에서 17.4㎜/일로 가장 약하였다. 동작구에서 기온과 관련한 자연재해 발생 기록은 없으나 기온 관련 현상일수를 서리일수, 결빙일수, 여름일수, 식물 성장 가능 기간 등으로 살펴보면, 서리일수는 81.3일로 서울특별시 평균인 87.7일보다 낮으며 결빙일수도 17.9일로 서울특별시 평균값인 18.3일보다 짧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동작구가 한강 변에 위치하고 전반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것에 기인한다. 여름일수는 122.6일로 서울특별시 평균인 121.8일보다 약간 길었고 식물 성장 가능 기간도 272일로 서울특별시 평균인 268.5일에 비해 길었다.
서리일수는 사당5동에서 87.8일로 가장 길었고 신대방2동에서 75.3일로 가장 짧았다. 결빙일수는 상도1동이 19.1일로 가장 길었고 신대방1동은 16.2일로 가장 짧았다. 식물 성장 가능 기간은 신대방2동이 278.5일로 가장 길었고 사당5동이 264.6일로 가장 짧았다.
동작구의 동별 기후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신대방2동은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이 가장 높고 미래에도 높으며, 열대야일수도 가장 많고 미래에도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신대방1동의 경우 호우일수가 가장 많고 미래에도 가장 많으며, 호우일수가 가장 적고 미래에도 적은 동은 흑석동이었다.
사당1동은 최고기온이 가장 높고 미래에도 가장 높으며 폭염일수도 가장 많고 미래에도 가장 많은 동이다. 따라서 온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폭염일수나 열대야일수의 증가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강수와 온도와 관련한 극한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기후 현상과 관련하여 행정 지방자치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작은 노력들도 필요하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기상청, 2014)
- 「대방천(동작구) 단면확장」 (서울특별시, 2019)
- 「도림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 완료보고」 (서울특별시, 2019)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연재해(自然災害)